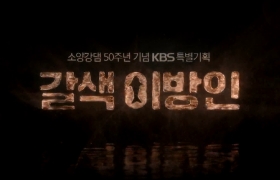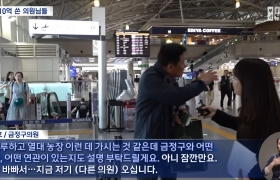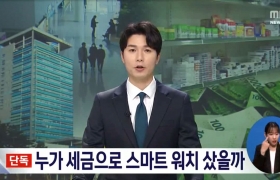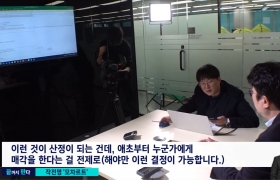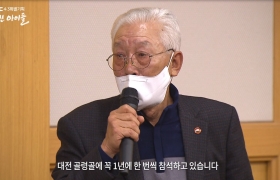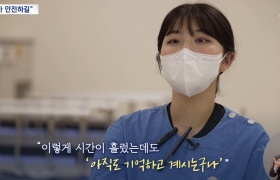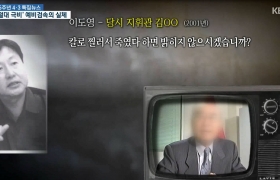햇빛∙바람에 멍들다 - 재생에너지의 명암
KBS광주 이성현
제107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수상 소감
도시사람들은 모르는 재생에너지 속 농어촌사람들의 눈물

사람들이 사라지는 농어촌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시설
정부와 지자체는 재생에너지가 낙후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청사진을 그려왔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2019년 농지법 개정으로 절대농지인 간척지마저 하나둘 태양광 사업지로 변모했고, 10년 가까이 이어진 가격 폭락 여파로 국내 천일염 주산지인 전남 신안과 영광의 대규모 염전 역시 태양광 사업의 표적이 되어버렸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자와 땅 주인의 계약 앞에 수십 년 농촌을 지켜온 임차농이며 천일염 생산자들은 생계터전을 잃고 그들의 삶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해상풍력 역시, 황금어장을 지켜온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는 멍들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찬반으로 입장이 갈리고, 보상을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지며 이젠 이웃이 아닌 원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농어촌의 눈물을 타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또다시 수도권과 대도시로 향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간척지며 염전, 해상풍력 공사가 한창인 바닷가, ‘10년 뒤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일터가 사라진 농어촌에 누가 들어와 살겠냐고, 나이 든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마을에는 태양광 패널만 덩그러니 남아 있을 거라고’. 지금처럼 사업자 중심의 입지 선정과 무분별한 허가 속에 농어촌을 파괴하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지방소멸을 더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라도 함께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농어촌민의 희생에 기반한 재생에너지정책 변화되어야
취재가 한창일 무렵 대통령이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그 결과 취재진을 바라보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관계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한 공사 관계자는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해 안 좋게 보도할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동안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긍정적인 내용이냐, 부정적인 내용이냐는 것이었다. 대답하기 난처했다.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은 긍정하면서도 농어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여러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다. ‘기후위기’라는 현실과 ‘온실가스 감축’이란 시대적 과제 앞에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지, 농어촌 희생만을 강요하는 지금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할 뿐이었다. 누군가는 고통 받고 있고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지만 나를 포함한 많은 대도시의 사람들은 내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관심하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에너지 전환의 과정은 당신들의 문제야’라고 할 게 아니라 공존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