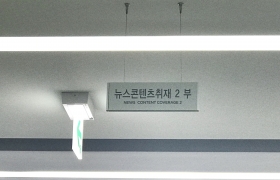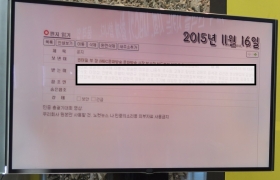“낙하산이 없는 회사에 다니자”
전 직장에 다닐 때 내가 항상 생각하던 말이다.
공직자들이 퇴진 후 노후수단으로 기관장으로 오거나,
여당 정치인이 자신들의 전리품인 마냥 공공기관장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지내면서
그들의 무소신과 무능력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 기관장들 중에 소신이 있거나 자리에 걸 맞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긴 어려웠다.
소신과 전문성이 있는 분이 기관장으로 있는 곳에서
일해 보는 것이 그 당시 나의 소원이었다.
그런 면에서 KBS와 MBC는 내가 가고 싶은 회사였다.
내부 구성원 중에서 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탁월한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구성원들의 역량이 뛰어나고 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했다.
기관장은 조직원들에게 선배이니 만큼
더욱 더 내부 구성원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했다.
이에 내부 단합도 더욱 잘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 생각은 KBS 입사와 함께 산산이 깨졌다.
대선후보의 언론특보가 사장으로 오지 않나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과 편파보도로 문제된 사람이 사장이 되질 않나
내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신망 보다는
외부의 시선을 더 신경 쓴 사람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은 자유가 없이 암울했다.
쉬운 인사권 남용은 언론인에게도 무서운 무기였다.
권력은 제 주머니속의 쌈짓돈인양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
권력은 언론을 장악하여 사실을 감싸고 은폐하려 했다.
지난 시절 동안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권력에 대한 감시와 약자에 대한 따뜻한 연민이 들어 있는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그 시작은 KBS 기자협회 제작거부로 시작했고 양대 노조의 파업으로
그 투쟁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지금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모였다. KBS는 구성원들의 의지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
고형석 / KBS






 KBS·MBC 총파업, 경영진 사퇴와 공영방송 정...
KBS·MBC 총파업, 경영진 사퇴와 공영방송 정...
 <영상기자 블랙리스트>, 김장겸을 정조준하다!
<영상기자 블랙리스트>, 김장겸을 정조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