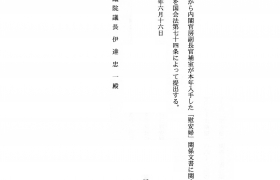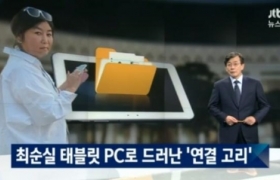카메라 기자의 빈자리
신고한 지 150일 만에 송환된 정유라를 공항에서 체포한 검찰과 그 뒤를 쫓는 위험한 레이싱이 도로 위에서 무법을 양산했다. 중앙선을 넘고 호송 차량을 가로막으며 속도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뉴스는 계속된다.
생방송을 연결한 회사는 한시라도 화면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더욱 필사적이다.
이미 덴마크 현지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호송되는 장면을 봐온 터라 낯설지 않은 풍경이지만 그 이면에 순서상 아쉬움이 남는다.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고 현지 경찰에 직접신고를 하면서 열린 판도라 상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 특종 Live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한 수였다.
신생 JTBC의 연이은 보도는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을 만했지만, 그곳에서 카메라 기자의 중요한 역할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다른 종합편성채널과 달리 카메라 기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사정은 나아졌다지만, 기자 개인에게도 드물게 찾아올 수 있는 특종 기회를 논란 속으로 묻어 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카메라 기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하고, 취재현장에서 뉴스를 만드는 방식,
그리고 영상구성에 대한 책임 있는 참여를 독려할 때만이 제일 나은 선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7년 대한민국 방송 취재현장은 이런 치열한 현장취재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취재기자와의 취재방식에 대한 토론은 갈등으로 보이기 쉽고, 취재 지휘권을 누가 가져야 옳은 가에
대한 대답은 경영진과 데스크에서 이미 정해놓고 일방적인 지시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취재 지휘권을 확보하지 못하자, 경영적 효율성을 핑계로 영상취재 부서를 자회사로 분사시키거나 부서를 폐지하고 취재부서 또는 제작국과 통폐합을 함으로써 순응하는 카메라 기자를 관리하려 들고
있다.
이런 행동의 저변에는 카메라 기자의 영상취재를 탈숙련화 함으로써 단순반복 업무로 만들어 뉴스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할지는 모르겠다. 질적인 문제는 뒤로하고, 양적인 면에서 자회사로 분사된 카메라 기자의 경우 하루 평균 2건의 리포트와 몇 건의 화면 단신을 취재하는 형태로 업무 강도는 높아졌다고 한다.
이는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과 테일러의 업무통제시스템을 지칭하는‘포디즘’과 그 모양이 닮았다. 뉴스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1913년 포드 자동차 조립공장은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
생산과정을 분화시켜 노동자가 단순 업무만을 하도록 했고, 프레더릭 테일러(Frederick W. Taylor)는 ‘시간과 효율의 연구’에서 개별 조립공정 노동자가 창조성, 판단력, 숙련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고도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대량생산방식의 법칙을 구체화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인지 미국에서는 취재기자 업무도 자동화, 탈숙련화 하려는 시도와 함께 뉴스 생산량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올드
미디어를 중심으로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졌고, 임금은 삭감됐다.
이제는 미국에서 기자직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미국식 포디즘을 적용한 한국식 영상취재부서 개악은 그러한 생각을 실행에 옮긴 데스크와 경영진에게도 창조성, 판단력이 필요 없고, 탈숙련화가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길 바란다. 매일 들어오는 시청자
제보 영상에만 목을 매 뉴스를 제작하려 들지 말고, 자사 카메라 기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취재의 장을 만들어 주길 권고한다. 시청자는 현장을 지배적으로 장악하지 못하고, 중요한 순간 방관자로서의 한계를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M. 카니와 아이작 게츠는 자유주식회사에서 ‘권한을 가진 직원은 스트레스를 즐긴다.’고 말하고
있다.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취재현장을 충분히 지배할 수 있는 카메라 기자에게는 가장 강한 스트레스인 죽음에 이르는 고통도 참고,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는 뉴스를 만들어 시청자에게 선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이라크 특수군을 따라다니며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싸움을 취재하던 '프랑스 텔레비지옹' 소속 기자 베로니크 로베르트 기자와 스테판 비르누브 기자의 순직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카메라기자의 인력 난 심각하다.
카메라기자의 인력 난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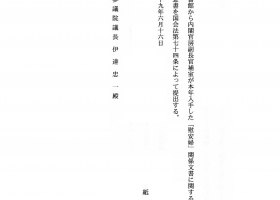 일본정부, 위안부 문서 각의 결정
일본정부, 위안부 문서 각의 결정